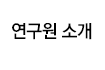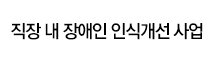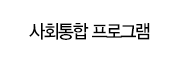민망하지만, 장애인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에서는 진리라도 되는 듯 돌고 도는 말이 있다. ‘장애인은 역시 공무원’이라는 말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기업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하다 결국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은 어떤 이점이 있기에 장애인들이 선호하게 된 것일까.
2016년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기준으로 선발인원이 비장애인 41명인데 비해 장애인은 5명이었다. 비교해보면 ‘큰 차이인가?’싶지만 지원자가 1만1819명 대 331명인 것을 알면 실로 놀랍다. 경쟁률이 일반 288:1인데 비해 장애인은 66:1에 불과한 것이다. 9급은 각각 일반이 128:1, 장애인이 16:1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보다 훨씬 인간적이라 볼 수 있는 숫자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 일반의 합격점수 컷이 396점이었던 한편 장애인의 합격점수 컷은 350점으로 일반보다 현저히 낮았다.
기술직으로 가면 당연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 장애인들의 이공계열 기피 현상이 크지만, 선발 인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사서/방호, 일반화공, 축산 등의 분야는 아직 장애인을 따로 뽑지 않으며,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부 모집구분 없이 1-6급의 장애인이 경쟁한다는 한계가 있다.
낮은 경쟁률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 편의 제공’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는 채용과정에서 편의제공보다 암묵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큰 반면 국가시험의 경우 장애에 대한 시험장 편의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 시험장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편의제공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에는 장애에 대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 서류와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토대로 편의제공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편의제공을 받게 된다. 상지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등에는 공통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이 제공되며 장애특성에 따라 답안 대필, 컴퓨터 작성도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장애인 별도 모집이 없는 시험(7,9급 외 나머지)에서는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언어장애인을 위해 면접시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이 가장 큰 차별을 겪는 면접전형이지만, 공무원 면접에서는 수화통역사 배치나 컴퓨터를 통한 필담면접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뿐만 아니라 터널시야를 위한 ‘축소문제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여러 면에서 차별 없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시험장 문턱이 낮다.
준비 과정은 어떨까.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은 시험공부도 일반적인 자료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험 준비는 인터넷강의 수강이 대부분인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이 없어 불편했었다. 하지만 14년도부터 KEAD디지털능력개발원을 통해 장애인 접근편의를 높인 강의들이 개발되면서 불편이 점점 줄었다. EBSi 수능 역시 자막제공을 하는 강의가 많아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강의 및 수험서 이용에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청년 세대에게 공무원은 꿈의 직장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렇다. 지난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취업준비자는 2014년 41만 명이었고, 2015년 45만 2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2013년 대졸자 이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세 청년층 취업준비자 중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험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7.9%, 25∼29세에서는 53.9%라고 했으며,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는 ‘9급 공무원시험’이 63.7%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20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불안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정년을 보장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좋은 조건의 연금혜택과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각종 복지혜택 등이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은 좀 더 절박한 이유로 공무원을 선호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74만70000원으로, 지난해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31만4000원의 75.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40%가 넘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였으며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8.2%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32%보다 26.2%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4만9517명인데 이중 15~29세 청년층은 전체의 3.9%뿐이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니 장애인 취업준비생이 갈 수 있는 곳은 공무원밖에 없는 것이다.
기성층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절반가량이 공시족이 되는 열풍을 우려한다. 도전정신이 충만할 20대 청춘들이 역동적인 미래를 꿈꾸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전에 왜 우리가 공무원을 꿈꿀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돌아봐 줬으면 한다. 일반 기업의 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배려가 있고, 차별이 없다면 ‘공무원 천국행’이라는 말이 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