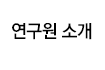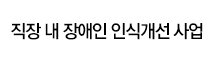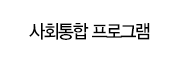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 둘이 아니라 셋이다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2005년 6월부터 시작한 삼성전자가 ‘장애인 나눔맞춤’ 고용책을 시작한지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한다. 올해는 전자관련 공고와 전문대에서 약 200명의 기술 장애인들을 고용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게다가 SK C&C 등이 장애인 무료 IT 교육 과정을 개강해 첨단과학을 장애인들에게 교육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장애인 고용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환경이 강화된 것도 있겠지만 사회의 의식이 좀더 ‘친 장애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반갑기 그지없다. 곰두리라는 말이 88서울올림픽에 맞춰 개최된 장애인올림픽의 상징이었고 어느새 둘이라는 단어가 장애인복지의 한 단어로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깔깔하다. 굳이 설명한다면 둘이라는 것은 1대1 또는 가장 기본적이 사회구성인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짝이 맞아야 한다는 발상은 항상 편가르기의 정석이고 또 대립과 상존의 공식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집단이 되려면 우선 최소 숫자는 셋이어야 한다. 그 셋이라는 숫자는 바로 대립과 상조 뿐 아니라 중재와 권고, 협력과 전진을 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셋’이라는 말이 아닐까? 하나는 외롭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아도취적인 데다가 자칫 자기소외에 빠질 우려가 많다. 그리고 둘은 협력하거나 대립함으로써 음모와 위계에 의한 지배적인 환경이 조성될 소지가 많다. 둘의 타협하거나 소외(=왕따)되거나 할 때 이를 중재하는 것이 제3의 인물이다. 기하학에서도 삼각형이 가장 단단한 구조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셋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사회(기업) 국가(지자체) 장애인이라는 삼각고리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과연 중재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될까? 그건 아무래도 고개가 갸우뚱한다.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장애인 고용구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과 집행이라는 것이 주된 업무이겠지만 결국 상당수의 열매를 자신들의 성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기업 역시 수혜적인 자세에 머믈러 일단 고용관계가 끝나면 ‘세 할 일 다했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 결국 이 삼자관계에서 둘러리로 되는 것은 항상 소수이자 능력이 열학한 장애인들이기 십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2월26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장애인 신규채용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286개소 중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248개소 중 62개 기관이 신규로 4,000명을 채용, 이중 가산점 부여와 구분모집 등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기관에서는 90여명의 장애인을 구분모집한다고 한다. 그리고 직무의 다양성을 꼽았다. 기존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어려웠던 병원, 연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의 경우 680여명의 채용인원 가운데 교수,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우대 채용키로 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11개 연구소에서 연구원 등 320여명의 채용규모 가운데 장애인에겐 전형별 가산점 부여 등을 실시하며 한국남동발전(주) 등 14개 기관에서는 460여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하면서 장애인에겐 역시 가산점 부여 및 일정비율을 적용해 채용한다는 것이다.” 아주 멋있는 장밋빛 공채내용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멋진 애드벌룬이다. 과연 정확히 몇 명의 장애인이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한 멋진 직장을 갈 수 있는 장애인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도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교육풍토가 그러한 직종을 위주로 꾸며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적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문은 열려있으나 현실은 어떨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가 떠오른다. 프로쿠르스테스는 여행자들이 오면 자신의 침대에 눕혀 그 몸이 침대보다 크면 도끼로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의 크기에 맞게 늘린다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물을 재단하는 편협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우리 장애인고용정책도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 아직은 장애인 고용은 정책과 선택이란 관문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질 못하고 있다. 아마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경야독하거나 ‘있는 집안의 부축과 보살핌 아래에서’ 공부한 장애인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가장 큰 부축이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의 현장은 여전히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 전부처럼 되어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역시 장애인 교육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건 사회 장애인 정책기관의 삼각대가 받쳐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삼각축이 제대로 기능할 때 사회와 장애인은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
|
| 다음글 | 나눔은 아름답지만... |
| 이전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