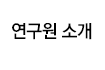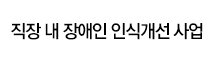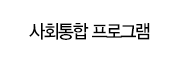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 아버지는 위대했다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아버지는 위대했다 #1. 장애자녀의 삶에 녹아든 아버지
#2. 딸의 아름다움에 빠진 아버지
#3. 아버지라는 ‘굴레’ 한국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흔히들 ‘업’이니 ‘굴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업이 되고 나가서는 가정의 업이 되고 굴레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요즘 젊은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만약 장애라면….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 예를 든 두 아버지도 기사에서 보인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억장을 느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버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위대함과 희생이었죠. 자신의 생활 속에 장애자녀를 거둬들인 것이죠. 결국 두 아버지는 장애자녀를 자신의 울타리에다 가둬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삶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녹아들었다는 것이 바를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두 아버지는 실의보다 삶의 쾌감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성(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
|
| 다음글 | 장애를 뛰어넘는 첨단과학 |
| 이전글 | 5월이면 생각나는 사람 - 故 장영희 서강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