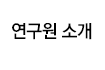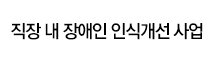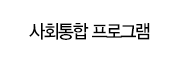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 지난 420들을 기억하며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지난 420들을 기억하며 문 영민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4월 20일,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 오전 조회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대뜸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민이를 위한 날이지”라고 말했다. 내가 휠체어로 다니기 편하게 책상들 사이의 간격을 넓혀놓으라고 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으러 갈 때 도와주라는 말도 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나는 선생님의 느닷없는 친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수업을 듣는 교실은 3층이었고 가파른 계단을 어머니와 함께 휠체어로 한참 올라갔어야 했는데, 학교 측에선 3년 내내 어떠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경사로도 없었고, 미술실과 음악실은 다른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친구들과 엄청난 높이의 계단들을 오르내려야만 했다. 어쨌든 그 특별한 ‘나의 날’에 하루종일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부담스러운 미소를 한 몸에 받으며, 하굣길에 빨개진 얼굴로 정문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헬렌 켈러가 주인공인 만화영화와 ‘장애인의 날 특별 생방송’을 TV로 보았다(그리고 1년 후 나는 “장한학생상”을 받으며 졸업했다). 대학교 신입생이던 8년 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처음 불렀던 그 날,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대학로에 나갔다(나는 자꾸 ‘장애인철폐의 날’이라고 말해 선배들에게 혼이 났다). 빨강 노랑 파랑 판넬에 무시무시해보이는 선전문구를 적어 들고서.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인 장소에 가본 것도 처음이었고,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본 것도 처음이었다. 행진을 하다 누군가 발언을 했고, 발언이 끝나면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을 외치며 팔뚝질을 했다. 무서운 얼굴의 사람들이 울고, 절규하고, 답답한듯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절박해 보이는 공간은 처음이었다. 당연한 것은 무엇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부끼는 깃발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고, 혼란스러웠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다. 집회가 끝나고 대학로 어딘가에서 선배들이 사주는 감자탕을 먹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감자탕을 먹어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은 3년 전 4월 20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있었던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였다. 나는 뒤늦게 도착해 무대와 한참 떨어진 뒤에서 문화제를 관망하며 이전 420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적 없는 외로움 같은 것을 느꼈다. 지하철을 타고 4호선 혜화역에서 내려 마로니에 공원까지 이동하며 날이 따뜻해진 봄날의 토요일, 데이트가 있는 듯 한껏 치장하고 나온 내 또래의 여학생들을 몇이나 지나쳤다. 그녀들을 지나쳐오니 마로니에공원 앞에는 한 무리의 경찰들이 서 있었고, 공원 안으로 들어오니 휠체어를 탄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었을법한 신입생들 여럿이 과, 반 혹은 동아리 선배들과 깃발을 들고 나와서 ‘새 물’과 같은 민중가요에 맞춰 ‘마임’이라고 불리는 율동을 했고, ‘장애해방가’를 불렀다. 나 역시 신입생일 때 그 무리에 끼어 장애해방가를 부르며, 함께 분노했었는데 이십대 중반의 나는 어쩐지 그 치열함에 몸을 담그지 못했다. 한 쪽에는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생존’을 위한 삶이 있었고, 또 한 쪽에는 주말 오후 애인과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는 ‘일상’을 가진 삶이 있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평범한 주말 오후의 ‘일상’을 위해 ‘생존’이 전제돼야 했다. 그래서 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한된 몸짓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장애해방가’를 불렀다. 나는 일상을 위해서건, 생존을 위해서건 그 순간 치열하지 못했다. 날씨가 좋아 대학로에 나가고 싶었고, 현장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선배를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매년 열리는 그 행사에 습관처럼 나갔을 뿐이다. 나는 문화제의 열기에 제대로 몰두하지 못했고, 외로웠다. 집회가 끝나고 함께 술을 마시자는 선배를 뒤로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다. 사회인이 되고 두 번째 맞게 될 올해 장애인의 날,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을 위한 ‘장애인의 날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공지와 함께 상품권을 받았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 행사 대신 주말에 대학로에서 열리는 장애인권영화제를 보러 가게 되었다. 집회나 문화제만큼이나 새로운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매해 변해가는 장애인의 요구들, 그리고 변함없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해 다른 모습으로 맞게 되는 4월 20일. 이 날은 내가 성장하는 양만큼, 매년 내게 다른 고민을 내놓는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다짐으로 맞닥뜨리게 될까? 반쯤은 두려움으로, 또 반쯤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올해 장애인의 날 공식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4월 18일에 열린다. |
|
| 다음글 |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희망 |
| 이전글 | 스포츠의 자유를 허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