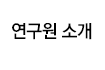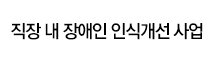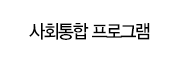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 ‘착한’ 장애인, ‘나쁜’ 드라마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착한’ 장애인, ‘나쁜’ 드라마 문영민 (saojungym@hanmail.net) 얼마 전에 막을 내린 <힘내요 미스터김>에는 주인공 '태평'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부잣집의 아들로 휠체어를 탄 '호경'이 등장한다. 그런데 넓은 마당이 있는 2층집에 외아들인 '호경'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마당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돌계단이 놓여져 있고, '호경'은 늘 1층의 거실과 자기방 만을 오간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당사자 역시 이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안쓰럽고, 한없이 착하기만 한 것인가? 우리나라 드라마 속 장애인은 너무 착하다. 휠체어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만 같은 알프스 소녀 클라라의 이미지는 지겨워질 법도 한데 여전히 TV 속에는 클라라의 클리셰가 가득하다. 오래 전 <추노>라는 드라마에는 영화 <오아시스>의 공주 이후 거의 처음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캐릭터 '선영'이 등장했다. '선영'은 자신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는 남편 '철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선영'의 캐릭터가 조선이라는 시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용구'나 드라마 <원더풀 마마> 속 '기남'은 어떤가?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지적장애인 '용구'와 늘 동생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착한 청각장애인 '기남' 역시 배경이 다를 뿐 클라라의 연장선에 서 있다. 미국 드라마 <닥터 하우스>의 주인공 '하우스'는 한 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 의사이다. 그는 훌륭한 진단과 의사이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여자 의사나 흑인 의사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은 예사이며, 왜소증을 가졌지만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장애인 환자에게 "넌 남의 엉덩이에 코를 박고 사는게 좋니?"라고 비꼬기도, 인공와우 수술을 원하지 않는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동의없이 인공와우를 이식하기도 한다. 물론 그의 독설은 자신만의 통찰과 철학 - 깊이 없는 자기긍정에 대한 비판이나 과학적 합리성의 신봉 - 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친하게 지내기 불쾌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상사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미성년자와 성추문을 만들고, 마약을 복용하고, 교통질서는 무시하기 일쑤이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내 친구이자 동료인 장애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나라 드라마 속 장애인에 대한 비평 역시 너무 착하다. 영화 <오아시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로 극찬을 받은 동시에 장애인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작품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주인공인 공주가 상상 속에서 비장애인의 몸을 꿈꾼 장면이고, 또 하나는 성폭행을 당한 남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설정이다. 후자의 비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자를 언급하는 장애인들이 "나는 단 한 번도 비장애인의 몸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적으로 우리 모두는 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를 가진 몸의 아름다움을 긍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운동의 '착한' 지향점일 뿐 이 사실을 개개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비장애인의 몸을 욕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속 장애인 캐릭터 모두가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는 없다. 현실의 장애인에게, 아니 아주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며 언제나 더 아름다운 타인의 몸을 꿈꾸기 마련이다. '하우스'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왜소증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십대 환자에게, "네 또래의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가 네 몸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영웅이거나 괴물이다"고 말한다. 결국 아이는 치료를 받는다. 대통령의 딸인 전도연과 평범한 경찰인 김주혁이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라하의 연인> 비평을 오래전 읽은 적이 있다. 전도연의 직장 동료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윤영준이 등장하는데, 비평가는 전도연이 동료인 윤영준이 아니라 김주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휠체어 장애인을 무성화(無性化)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의 장애인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는 명제는 당위일 뿐이다. 드라마 속의 모든 장애인이 해피엔딩을 맞거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미디어 속 장애인 캐릭터에 대한 비판들은 공통적으로 착한 이상을 강조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장애인의 모습과 간극을 만들어낸다. 나는 '나쁜' 장애인, '찌질한' 장애인, '주인공이 아닌' 장애인을 드라마 속에서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장애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스토리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 무기력하고 한없이 착한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당신 옆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인식을 개선하는 '문화운동'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장애에 대한 이상적인 지향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리얼리티까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큐가 아닌 이상 드라마의 세계는 당위가 아닌 현실의 세계를 모델로 한다. 그리고 물론, 변화는 현실의 세계에서 시작된다.  |
|
| 다음글 | 재해에 사면초가인 장애인들 |
| 이전글 |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