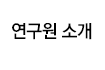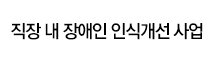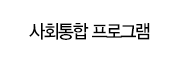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 ‘장애인복지’는 ‘남는 돈 복지’인가?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장애인복지’는 ‘남는 돈 복지’인가? 전동성 (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복지는 선심?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희망의 새시대’로 막 올린 현 정부의 6개월은 특히 그 힘차게 쏴올린 ‘맞춤형 복지’는 벌써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로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재원’이지만 현 정부는 증세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결국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자 봉급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해답은 원대복귀였다. 그야말로 복지는 선심이라는 말이 그대로 부각된다. 선심은 결국 주는 자의 잣대로 이뤄지는 가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재원의 확보는 생각도 없이 ‘주고 싶은 계층’에게 선심을 쓰는 복지가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욕구가 강한 계층은 말도 많고 탐욕도 크다. 그들을 달래기엔 그 탐욕의 정도가 아주 깊은 것을 현 정부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대 정권이 벌려놓았던 무상급식도 그렇고 현 정부가 시작한 영유아 부축도 그렇다. 일부의 ‘선별적 지원’은 공리주의에 묻혀 그대로 흘러갔다. 결과는 역시 돈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사각지대에 묻힌 장애인복지에 대해선 아무런 눈길도 도움의 손짓도 하지 않은 채 또 추석을 보내려하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의 힘으로는 턱도 없는 몸짓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행동권 제약을 해소할 힘도 그들에겐 없다. 오르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외엔 없기에. 하지만 그 정부도 선거의 논리로 또 선거의 공약에 매몰되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애처로울 뿐이다. #모두가 바쁘다 보니..  며칠 전 조선일보가 지하철 노약자용 승강기의 현실을 보도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네들을 위해 만든 엘리베이터가 건강한 성인들이 ‘바쁜 일상’을 위해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특히 장애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힘에 밀려 우선순위에 밀려 이용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아마 10여년전 파리를 방문했을 당시 루부르 박물관을 관람하려고 차례를 기다리던 중 당한 필자의 당혹감이 떠오른다. 일반 방문자들의 틈에 섞여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박물관 안내인이 급히 달려오더니 무조건 내 팔을 이끌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장애인용 리프트로 가더니 타라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장애3급으로 다리를 절었다. 그는 장애인이므로 꼭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난 유럽의 복지의 한 부분을 실감한 것이었다. 그 큰 리프트에 혼자 타고 아래층으로 동행들 보다 먼저 내려온 나는 오히려 동행한 동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헛웃음만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느끼기에 남보다 한걸음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언가 살아가는 느낌을 주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아직은 장애인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좀더 자신의 삶과 인생이 고달프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들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해줄 것이 아닐까? 묘한 비교심리가 나를 감싼다. #용감한 사람들의 비명 장맛비가 쭈룩쭈룩 쏟아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로의 한켠에서 휠체어에 싼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 통행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외롭게 빗속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모두가 바쁜 것이다. 그러나 의사당 출입경비를 서던 한 순경이 우산을 들고와 빗속의 그를 감쌌다. 그 순경은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그 장애인과 함께 서있었다고 한다. 묘한 대칭의 그림이었다. 자신의 처절함을 몸으로 행동하는 장애인도 그렇지만 그것을 말없이 우산 하나로 받쳐주는 순경의 지긋한 행동도 한 폭의 그림처럼 많은 통행인들과 지나치는 버스와 승용차들의 물결의 뇌리 속에 담겨졌으리라. 장애를 담고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장애를 곁에서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장애인들이다. 장애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절벽’의 고통을 모른다. 하물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치’를 위해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태운다. 그들은 오직 ‘다(多)’에만 목을 매단다. 작은 것들이 모여 ‘다(多)’가 된다는 논리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쁘기 때문이다. 바쁘니까 그냥 달리기만 한다. 만일 장애인들이 ‘다’가 된다면 그들은 역시 그리로 몰려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역량을 발휘해 많은 안건을 내고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할 것이 분명하니까. 현 정부의 복지정책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통행권확보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있는 시설에 약간의 머리와 수선이 필요할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이해와 관용이라는 질서와 약간의 규제가 들어간다고 본다. 숱한 구호와 전시적인 정책이 때로는 허황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될 경우 그 정부는 실정의 그늘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과거 정부의 예에서도 숱하게 보여주었던 것들이다. 국가의 작은 기본이 결국 국가의 틀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추석이 온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그 추석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한 뭉치의 선물이 아니라 그 추석을 추석답게 맞이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올해가 안되면 다음 추석에라도 또 아니면 그 다음의 추석이라도 마음 놓고 스스로 움직여 맞이할 수만 있다면... |
|
| 다음글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기다리며 - 장애인 극단 ‘애인’ 의 <고도를 기다리며> - |
| 이전글 | 장애인의 자가운전권과 직업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