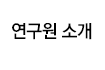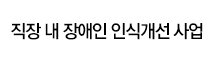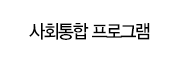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기다리며 - 장애인 극단 ‘애인’ 의 <고도를 기다리며> -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기다리며 - 장애인 극단 ‘애인’ 의 <고도를 기다리며> - 최문정(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삶을 살아내는데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어느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다림이 언제부터였는지, 그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채 둘은 종일 부질없는 대사와 동작을 주고받는다. 유명한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다. 수십, 수백 번은 더 반복됐을 이 연극이 이번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연기로 재탄생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어느 시골 길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언제부터 왜 기다리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고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실재와 허구를 오가는 인간의 희망이 순수하게 재조명된다. 극단 애인의 연극은 ‘에이블 아트(able art)’로 일궈낸 작품이다. 차이의 예술을 표방하는 에이블 아트로 표현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장애인의 시선으로 작품을 보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극단 애인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매 해 공연하고 있다. 베케트의 작품은 허무와 고독, 절망이 담겨 있다고들 말한다. 오지 않는 인물을 기다리다 지쳐가면서 의미 없는 행동을 거듭하는 <고도를 기다리며>도 그렇다. 들뢰즈가 베케트의 인물 특성을 분석해 내놓은 ‘소진된 인간’ 또한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로한 인간’이 무언가를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이지만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다면 ‘소진된 인간’은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소진된 인간은 피로한 인간을 훨씬 넘어선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지점에서 반전은 시작된다. 우리가 무엇을 ‘가능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이유와 근거를 따져 추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것’은 기존 질서나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실은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반면 ‘잠재적인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쓸모없는 인간들로 보이는 베케트의 작품 인물들은 지배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 들을 죄다 소진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개인과 세계에 ‘잠재된 힘’을 보여준다. <쿼드>의 배우들이 무의미한 반복 행동으로 가운데 지점을 피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소진 돼 버린’ 것처럼 끝난 사건들은,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다. 소진은 소진을 통해 생성의 힘을 보여준다. 장애인 극단이 보여 준 <고도를 기다리며>는 베케트가 보여주고자 한 개인과 세계의 ‘잠재된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만들어 낸 장애, 그 속에서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고도는 지금 이 순간 그들과 우리로 나눠진 이분법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함께’ 고도를 기다리자고 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예술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 다음글 | 장애아동들은 무슨 책을 읽을까? |
| 이전글 | ‘장애인복지’는 ‘남는 돈 복지’인가? |